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 산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배우지만, 과연 모든 생명체에게 그럴까요? 놀랍게도 지구상에는 산소 없이도 잘 살아가는, 심지어 산소가 독이 되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고, 때로는 상처 부위가 심하게 곪는 현상 뒤에도 바로 이 산소와의 '관계'가 다른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이 산소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분류되는 호기성, 혐기성, 그리고 편성 혐기성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미생물학적 지식을 넘어 식품, 의학, 환경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에너지 생성 방식'과 '산소 독성 방어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산소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산소의 해로운 영향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반면, 어떤 미생물은 산소 없이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거나, 산소의 독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이들의 생존 전략과 서식지를 결정짓는 것이지요. 자, 그럼 산소를 둘러싼 미생물들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생명의 에너지 화폐 ATP 그리고 산소의 역할
모든 생명 활동의 근본적인 동력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듯, 미생물 역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ATP(Adenosine Triphosphate)라는 분자 형태로 저장되고 사용됩니다 [1].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세포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생물은 이 ATP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포 호흡(Cellular Respiration)입니다. 특히 호기성 호흡(Aerobic Respiration)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산화시켜 다량의 ATP를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소(O₂)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바로 최종 전자 수용체(final electron acceptor)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아니, 최종 전자 수용체라니?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전자를 받아주는 게 뭐 대수라고?
얼핏 생각하면 전자를 받는 역할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생산 과정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세포 호흡 과정, 특히 전자전달계(Electron Transport Chain, ETC)에서는 유기물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ATP를 합성합니다 [3]. 마치 물레방아가 물의 흐름(전자의 흐름)을 이용해 동력을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자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레방아에 물이 계속 흘러야 하듯, 전자전달계에서도 전자가 마지막 단계까지 원활하게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넘겨져야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호기성 호흡에서는 바로 산소가 이 마지막 전자 수용체의 역할을 합니다.
전자를 받아 물(H₂O)로 환원되면서 전자 전달 과정을 완결시키는 것이지요 [2]. 만약 산소가 없다면 전자의 흐름은 막히게 되고, 마치 물길이 막힌 물레방아처럼 ATP 생산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는 호기성 호흡은 다른 어떤 에너지 생산 방식보다 훨씬 많은 ATP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명체가 산소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강력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라는 매우 반응성이 높은 독성 부산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4]. 이는 세포 내 DNA, 단백질, 지질 등을 손상시켜 세포 기능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사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사용하는 생명체는 이러한 산소 독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어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마치 강력한 에너지를 다루는 공장에서 안전 장치가 필수적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산소와의 관계에 따라 나뉘는 미생물의 세 가지 주요 그룹, 즉 호기성균, 혐기성균, 편성 혐기성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그룹이 산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산소 독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면 이들의 생존 전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기성 세균 산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생명체
호기성 세균(Aerobes)은 이름 그대로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입니다. 이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1]. 마치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호기성 세균에게 산소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는 호기성 호흡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2].
호기성 세균은 세포 내에 완벽한 전자전달계(ETC)를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소가 전자를 받아 물로 환원되는 과정을 통해 대량의 ATP를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이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얻는 다른 방식(혐기성 호흡이나 발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 빠른 성장과 번식, 복잡한 대사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우리가 사는 환경, 특히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피부, 토양 표면, 물 표면 등에는 이러한 호기성 세균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산소는 독성 물질(ROS)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호기성 세균은 그 독성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맨날 산소랑 같이 사는데 괜찮은 거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산소는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활성산소종(ROS)이라는 세포에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4]. 따라서 산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호기성 세균은 이러한 산소 독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방어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산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호기성 세균은 주로 두 가지 중요한 효소를 통해 활성산소종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Superoxide Dismutase, SOD)로, 매우 반응성이 높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O₂⁻)을 비교적 덜 해로운 과산화수소(H₂O₂)와 산소(O₂)로 전환시킵니다 [5].
두 번째는 카탈라아제(Catalase) 또는 과산화효소(Peroxidase)로, SOD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H₂O₂)를 무해한 물(H₂O)과 산소(O₂)로 분해합니다 [5]. 이 두 효소, SOD와 카탈라아제는 호기성 세균이 산소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호기성 세균으로는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고초균(Bacillus subtilis),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등이 있습니다. 결핵균은 산소가 풍부한 폐에서 주로 서식하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6]. 고초균은 토양이나 공기 중에 흔히 발견되는 세균으로, 일부 균주는 유익한 효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녹농균은 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입니다 [7]. 이들 모두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며, 산소 독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과 산소 독성 방어 시스템을 모두 갖춘, 산소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기성 세균 산소 없이도, 또는 산소를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들
이제 산소와의 관계가 조금 다른 미생물 그룹, 혐기성 세균(Anaerobes)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미생물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1]. 하지만 이 '혐기성'이라는 말 속에는 산소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여러 하위 그룹이 포함되어 있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기성이라고 하면 그냥 산소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복잡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소를 '싫어한다' 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산소에 대한 '내성'이나 '활용 능력'에 따라 크게 통성 혐기성균(Facultative Anaerobe), 내기성 혐기성균(Aerotolerant Anaerobe), 그리고 뒤이어 설명할 편성 혐기성균(Obligate Anaerob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마치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기도 하는 사람(통성), 육식은 안 하지만 육식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내기성), 그리고 고기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하는 사람(편성)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통성 혐기성균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카멜레온
통성 혐기성균(Facultative Anaerobe)은 산소가 있을 때는 호기성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을 때는 혐기성 호흡이나 발효(Fermentation)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아주 유연한 미생물입니다 [3]. 즉, 환경에 산소가 있든 없든 살아남을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그룹입니다. 이들은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존재하면, 통성 혐기성균은 호기성 세균처럼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여 호기성 호흡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양의 ATP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환경에 처하면, 이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질산염(NO₃⁻)이나 황산염(SO₄²⁻)과 같은 다른 무기물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는 혐기성 호흡(Anaerobic Respiration)을 하거나, 또는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유기물을 불완전하게 분해하여 소량의 ATP를 얻습니다 [8]. 발효는 전자전달계를 사용하지 않고 기질 수준 인산화(Substrate-level phosphorylation)만으로 ATP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산소 독성에 대한 방어 능력은 어떨까요? 통성 혐기성균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과 마찬가지로 SOD와 카탈라아제 같은 활성산소종 제거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이 덕분에 산소 존재 하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산소를 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통성 혐기성균으로는 우리 장 속에 많이 살고 있는 대장균(Escherichia coli), 피부나 점막에 상재하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그리고 빵이나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효모(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등이 있습니다 [1, 9]. 대장균은 산소가 풍부한 소장 상부에서도 살 수 있지만, 산소가 거의 없는 대장에서도 왕성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효모 역시 산소가 있으면 호흡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얻지만, 산소가 없으면 알코올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얻으며 우리가 즐겨 마시는 맥주나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통성 혐기성균은 다양한 산소 농도 변화에 적응하여 폭넓은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내기성 혐기성균 산소는 무시할 뿐
다음으로 살펴볼 그룹은 내기성 혐기성균(Aerotolerant Anaerobe)입니다. 이들은 산소를 에너지 생산에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2]. 즉, 산소의 존재 유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산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기성 혐기성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오직 발효(Fermentation)에만 의존합니다 [8]. 이들은 호기성 호흡이나 혐기성 호흡에 필요한 전자전달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소가 있든 없든 항상 같은 방식, 즉 발효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ATP를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산소를 쓰지도 않는데 산소 있는 데서 어떻게 살아? 산소 독성은 괜찮은 거야?
이 부분이 내기성 혐기성균의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산소를 에너지 대사에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소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어느 정도의 산소 독성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기성 혐기성균은 SOD(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는 가지고 있어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O₂⁻)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카탈라아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산화수소(H₂O₂)는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5]. 이 때문에 매우 높은 농도의 산소에서는 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기 중의 산소 농도에서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환경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내기성 혐기성균으로는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의 여러 종류, 예를 들어 김치나 요구르트 발효에 관여하는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속 세균들이나, 편도선염 등 화농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속 세균 일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10]. 이들은 산소 유무와 관계없이 발효를 통해 유산(lactic acid)과 같은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산성 환경은 다른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기성 혐기성균은 산소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견뎌낼 수 있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진 미생물 그룹입니다.
편성 혐기성균 산소는 곧 죽음
이제 마지막 그룹인 편성 혐기성균(Obligate Anaerobe)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적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1]. 편성 혐기성균에게 산소는 단순한 불필요한 기체를 넘어, 치명적인 독(poison)으로 작용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산소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성장이 억제되거나 사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니, 산소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라고? 대체 왜 그런 거야?
편성 혐기성균이 산소에 극도로 민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들은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대사 경로, 즉 호기성 호흡 시스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대신 혐기성 호흡 (산소 외 다른 물질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이나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8]. 혐기성 호흡은 질산염(NO₃⁻), 황산염(SO₄²⁻), 이산화탄소(CO₂) 등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며, 발효는 유기물 자체를 전자 수용체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호기성 호흡에 비해 ATP 생산 효율이 낮습니다.
둘째,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편성 혐기성균이 산소 독성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들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 5]. 앞서 호기성균과 통성 혐기성균이 SOD와 카탈라아제를 이용해 활성산소종(ROS)을 제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편성 혐기성균은 이 두 가지 핵심 방어 효소가 모두 없거나, 그 활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산소에 노출되면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 독성 물질들이 세포 구성 성분들을 무차별적으로 손상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처럼, 산소와의 접촉 자체가 이들에게는 생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셈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편성 혐기성균은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특수한 환경에서만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깊은 토양 속, 늪지나 호수 바닥의 퇴적물, 동물의 소화기관(특히 대장), 산소 공급이 차단된 괴사 조직이나 깊은 상처 부위 등이 이들의 주된 서식지입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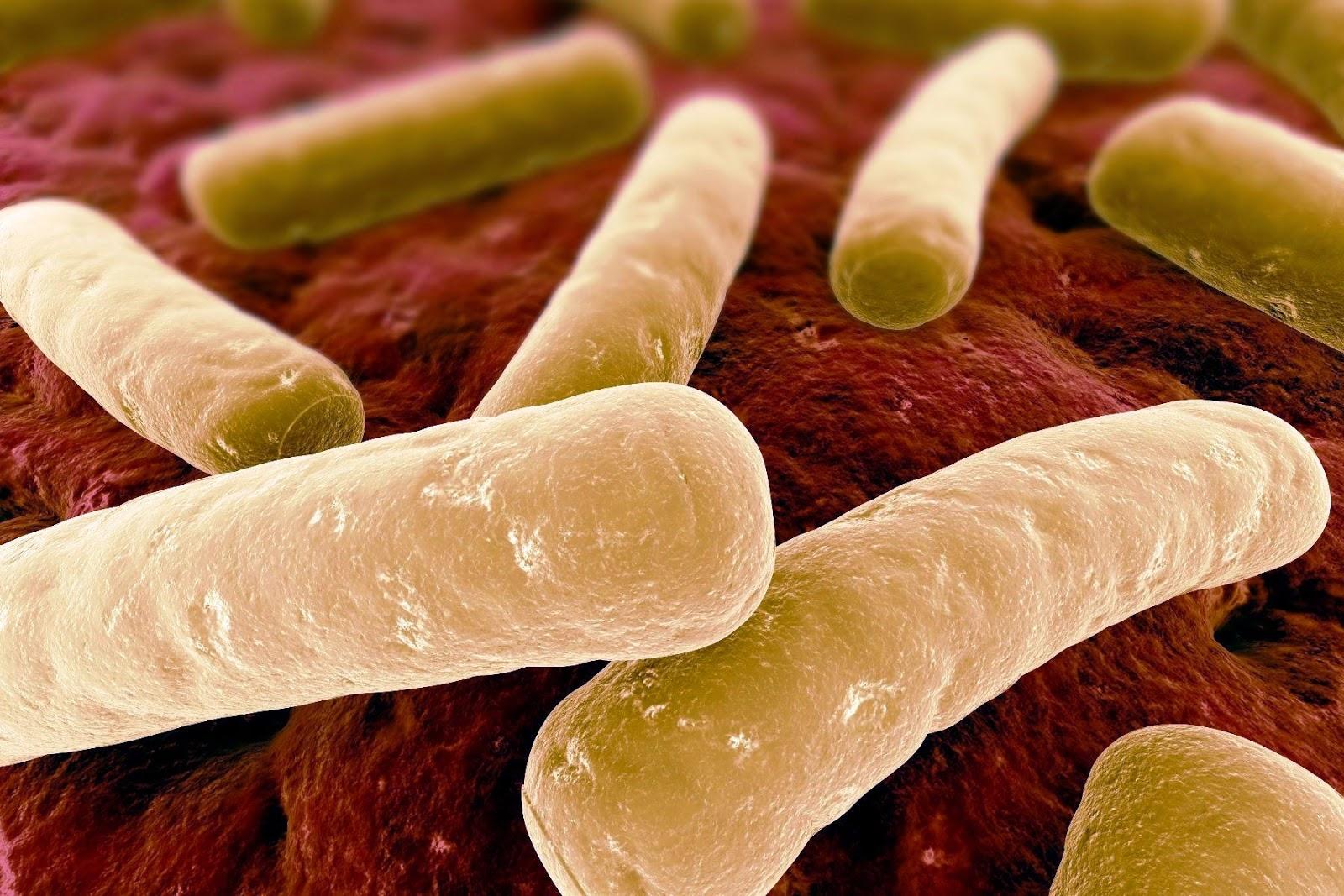
대표적인 편성 혐기성균으로는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 가스 괴저균(Clostridium perfringens)과 같은 클로스트리듐(Clostridium) 속 세균들과, 우리 장내 미생물 군집의 중요한 구성원인 박테로이데스(Bacteroides) 속 세균 등이 있습니다 [12, 13].
파상풍균은 녹슨 못 등에 의해 깊은 상처가 났을 때 침입하여 신경 독소를 분비하고, 보툴리누스균은 잘못 보관된 통조림 등 산소가 없는 식품에서 증식하며 강력한 신경 독소를 생산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테로이데스 속 세균은 평소 장 내에서 다당류 분해 등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수술 등으로 인해 다른 부위로 이동하면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편성 혐기성균은 산소 없이 살아가는 데 특화되었지만, 산소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 산소 노출 시 생존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살아가는 미생물입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호기성, 통성 혐기성, 내기성 혐기성, 편성 혐기성
지금까지 산소 요구성에 따라 미생물을 크게 호기성, 혐기성(통성, 내기성 포함), 편성 혐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각 그룹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분 | 산소 요구성 | 주요 에너지 생성 방식 | 산소 독성 방어 효소 (SOD, Catalase) | 대표적인 예시 | 주요 서식지 |
|---|---|---|---|---|---|
| 호기성 세균 | 반드시 필요 (Obligate Aerobe) | 호기성 호흡 | 모두 보유 (+ / +) | Mycobacterium tuberculosis, Bacillus subtilis, Pseudomonas aeruginosa | 공기 중, 토양/물 표면, 피부 등 산소가 풍부한 곳 |
| 통성 혐기성균 | 있으면 사용, 없어도 생존 (Facultative Anaerobe) | 산소 O: 호기성 호흡 산소 X: 혐기성 호흡 또는 발효 |
모두 보유 (+ / +) |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Saccharomyces cerevisiae (효모) | 다양한 환경 (산소 유무 변화에 적응) |
| 내기성 혐기성균 | 불필요, 하지만 견딤 (Aerotolerant Anaerobe) | 발효 | SOD 보유, Catalase 부족 (+ / -) | Lactobacillus sp., Streptococcus pyogenes | 발효 환경, 점막 등 (산소 존재해도 생존 가능) |
| 편성 혐기성균 | 독성, 절대 불가 (Obligate Anaerobe) | 혐기성 호흡 또는 발효 | 모두 부족 (- / -) | Clostridium tetani, Clostridium botulinum, Bacteroides fragilis | 깊은 토양, 퇴적물, 장 내, 괴사 조직 등 산소 없는 곳 |
이 표는 각 그룹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산소'입니다. 산소가 생존에 필수적인지(호기성),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지(통성 혐기성), 아예 필요 없고 견딜 뿐인지(내기성 혐기성), 아니면 치명적인 독인지(편성 혐기성)에 따라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소 요구성은 주된 에너지 생성 방식과 산소 독성 방어 효소(SOD, Catalase)의 보유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2, 5].
호기성균과 통성 혐기성균은 산소를 활용할 수 있기에 SOD와 Catalase를 모두 보유하여 산소 독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반면, 편성 혐기성균은 산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독성에도 취약하여 두 효소가 모두 부족합니다. 내기성 혐기성균은 그 중간적인 특징을 보여, 산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SOD를 보유하여 어느 정도의 산소 노출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미생물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성 혐기성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 부위에 산소 공급을 늘리거나(과산화수소 소독 등), 혐기성 대사를 저해하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14]. 반대로 김치나 요구르트처럼 유산균(주로 내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의 발효를 이용하는 식품을 만들 때는 적절한 혐기 조건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산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미생물을 호기성, 혐기성(통성, 내기성), 편성 혐기성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단순해 보였던 '산소'라는 기체 하나가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생존과 사멸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이들의 에너지 대사 방식, 방어 시스템, 나아가 서식 환경까지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산소 독성까지 완벽하게 방어하며 번성합니다. 통성 혐기성균은 산소 유무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내기성 혐기성균은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만의 방식(주로 발효)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편성 혐기성균은 산소를 치명적인 독으로 여기며, 산소가 없는 은밀한 곳에서만 생존하는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핵심 원리는 에너지 생성 방식의 차이와 산소 독성 방어 능력의 유무였습니다.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는 호기성 호흡의 높은 효율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종(ROS)을 제거하는 SOD와 카탈라아제와 같은 효소 시스템의 존재 여부가 각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의 다양한 산소 요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 충족을 넘어 의학, 식품 과학, 환경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식품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며, 환경 정화에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소를 둘러싼 미생물들의 다양한 생존 전략은 지구상 생명의 놀라운 다양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의 세계에도 이처럼 치열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2025.04.15 - [임상화학] - 모세관 전기영동법 (Capillary electrophoresis)의 원리와 방법, 적용 분야
모세관 전기영동법 (Capillary electrophoresis)의 원리와 방법, 적용 분야
모세관 전기영동법(Capillary Electrophoresis, CE)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화학, 특히 생화학이나 제약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분
labdoctor.tistory.com
2025.04.15 - [분자진단] - Microarray 검사의 원리와 방법, 적용 분야
Microarray 검사의 원리와 방법, 적용 분야
여러분은 혹시 수천, 수만 가지 종류의 상품이 빼곡히 들어찬 거대한 창고에서 특정 상품 몇 가지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
labdoctor.tistory.com
2025.04.13 - [분자진단] - 염기서열분석의 역사와 종류, 특징, 차이점
염기서열분석의 역사와 종류, 특징, 차이점
인류는 오랫동안 생명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마치 복잡한 기계의 설명서를 읽듯,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려는 시도는 과학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지요. 여
labdoctor.tistory.com
2025.04.13 - [분자진단] -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T-PCR)의 원리와 방법, 적용 분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T-PCR)의 원리와 방법, 적용 분야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같이 발표되는 확진자 수 뒤에는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 검사의 노력이 숨어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역전
labdoctor.tistory.com
2025.04.13 - [분자진단] -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개념, 원리, 방법, 적용 분야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개념, 원리, 방법, 적용 분야
이번 시간에는 현대 생명과학과 의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기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몇 년 전, 유명 할리우드
labdoctor.tistory.com
참고문헌
[1] Madigan, M. T., Martinko, J. M., Bender, K. S., Buckley, D. H., & Stahl, D. A. (2018). Brock Biology of Microorganisms (15th ed.). Pearson.
[2] Willey, J. M., Sherwood, L. M., & Woolverton, C. J. (2017). Prescott's Microbiology (10th ed.). McGraw-Hill Education.
[3] Berg, J. M., Tymoczko, J. L., & Stryer, L. (2015). Biochemistry (8th ed.). W. H. Freeman and Company.
[4] Imlay, J. A. (2008). Cellular defenses against superoxide and hydrogen peroxide. Annual Review of Biochemistry, 77, 755–776.
[5] Brioukhanov, A. L., & Netrusov, A. I. (2004). Catalase and superoxide dismutase: distribution, properties, and physiological role in cells of strict anaerobes. Biochemistry (Moscow), 69(9), 949–962.
[6] Russell, D. G. (2001). Mycobacterium tuberculosis: here today, and here tomorrow.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2(8), 569–577.
[7] Gellatly, S. L., & Hancock, R. E. (2013). Pseudomonas aeruginosa: new insights into pathogenesis and host defenses. Pathogens and Disease, 67(3), 159–173.
[8] Unden, G., & Bongaerts, J. (1997). Alternative respiratory pathways of Escherichia coli: energetics and transcriptional regulation in response to electron acceptors.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 - Bioenergetics, 1320(3), 217–234.
[9] Todar, K. (2020). Todar's Online Textbook of Bacteriology. Retrieved from http://textbookofbacteriology.net/
[10] Klaenhammer, T. R. (1988). Bacteriocins of lactic acid bacteria. Biochimie, 70(3), 337–349.
[11] Loesche, W. J. (1969). Oxygen sensitivity of various anaerobic bacteria. Applied Microbiology, 18(5), 723–727.
[12] Brook, I. (1999). Anaerobic Infections in Children. Advances in Pediatrics, 46, 261-297.
[13] Wexler, H. M. (2007). Bacteroides: the good, the bad, and the nitty-gritty. Clinical Microbiology Reviews, 20(4), 593–621.
[14] Nagy, E. (2015). Anaerobic infections: update on treatment. Current Opinion in Infectious Diseases, 28(5), 446-451.
'임상미생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균배양검사를 위한 배지의 종류 (0) | 2025.04.17 |
|---|---|
| 미생물 검체의 운송 및 접종 (0) | 2025.04.17 |
| 미생물 검사 자동화 배양법 (0) | 2025.04.16 |
| 진단검사실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안전 상자의 종류와 기능 (1) | 2025.04.15 |
| 미생물 검체의 채취 방법 (검체별 채취, 주의 사항) (0) | 2025.04.15 |




댓글